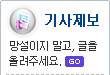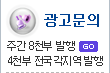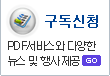|
|

|
|
연복군 장말손 선생 종택 방문기
|
|
2024년 10월 07일(월) 08:54 [(주)문경사랑] 
|
|
|

| 
| | | ↑↑ 정창식
아름다운선물101
법무사 정창식사무소 대표 | ⓒ (주)문경사랑 | |
“선조께서 찾아온 손님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늘 부족합니다.”
누마루가 있는 사랑채 작은 방에서 종손은 우리에게 겸양하였다. 예로부터 접빈(接賓)은 지켜야 할 전통적인 가문들의 가례(家禮)였다. 현재에 이르러 사라져가고 있다지만 종손은 다과를 내어놓으면서도 애써 접빈(接賓)의 예를 다하려 했다. 문득, 종손이 조금 전 누마루 기둥을 가리키면서 하던 말이 떠올랐다.
“좌우 양쪽의 기둥은 참꽃나무이고 가운데 두 기둥은 싸리나무를 썼습니다.”
종손은 저렇게 400년이 넘도록 좀 쓸지 않고 굳건한 것은 조상들이 좋은 나무를 사용한 때문이라고 했다. 종손의 안내로 사랑채 마루에 올랐다. 누마루였다. 계자난간 너머로 바깥 풍경이 보였다. 문 앞의 옥답(沃畓)과 야트막한 동산이 종택을 포근히 감싸는 형상이었다. 마음이 평안했다. 고개를 들었다. 처마 밑에 편액(扁額)들이 걸려있었다.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다. 조선시대 문신 점필재 김종직과 정암 조광조였다. 조광조의 글씨는 친필이라고 했다.
연복군(延福君) 장말손, 그는 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신으로 불천위(不遷位)에 오른 인물이다. 호는 송설헌(松雪軒)으로 1459년(세조5년) 문과에 급제했다. 승문원 박사와 사헌부 감찰, 사간원 정언이 되어 1465년 함경도 병마도사에 부임하였다. 이때, 여진족과 해적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듣거니 그대 담소로 적을 물리쳐(聞君談笑能却賊)/ 자잘한 무리 얼씬도 못했다지(魚樵不敢近城池)…”
변방에서 공을 세웠다는 소식을 들은 허백당(虛白堂) 홍귀달 선생은 그에게 칭송하는 시를 보냈는데, 이 또한 편액으로 남아 있다.
“이 패도(佩刀)는 변방의 적들을 물리치고 조정에 돌아와 임금이 하사하신 것입니다.”
공을 세우고 돌아온 그에게 임금은 보물 제881호로 지정된 패도(佩刀)와 옥피리(玉笛), 은잔(銀盃)을 하사했다. 은잔은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잃어버렸다 한다. 종손은 패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25 전쟁 때 종택을 인민군이 사용하면서 이 패도에 욕심을 가지고 땅에 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지게 되자 잊어버리고 급히 후퇴하였다고 한다. 그 후 27년이 지난 뒤 선친의 꿈에 선조께서 현몽하여 패도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자 세조는 함경도로 다시 그를 보냈다. 그때 난을 평정한 공로로 보물 제604호로 지정된 적개공신상훈교서(敵慨功臣賞勳敎書)를 받게 되고 1469년에는 보물 제881호로 지정된 공신회맹록(功臣會盟錄)이 내려졌다고 한다.
52세가 된 해인 1482년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지금의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화장마을로 낙향해 송설헌(松雪軒)을 지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연복군에 봉(封)해졌다. 1486년 6월(음력) 세상을 떠나자 임금은 ‘안양(安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지금의 종택은 연복군의 손자 대(代)에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로 이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3년 인동장씨 연복군파 중앙종회장인 장사원 전 문경시의원이 그때의 송설헌 정자 옆에 기공비 등을 세워 종택의 위엄과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종손은 송설헌 16세 종손 장덕필 옹이다.
누마루 기둥을 다시 보았다. 살펴보면, 400년이 지나도 저렇듯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음은 무엇보다 훌륭한 선조에 대한 후손들의 숭조(崇祖)와 돈종(惇宗)의 마음 때문일 터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면 다시 몇백 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이 굳건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