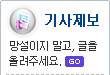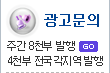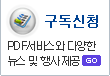|
|

|
|
뉴스로 세상읽기(17)-일본-사할린-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한다 (1)
|
|
2020년 10월 30일(금) 17:03 [(주)문경사랑]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일본은 섬 나라다. 아주 옛날에는 한반도(韓半島)와 붙어 있다가 점점 멀어지면서 섬나라가 됐다. 지질학자들은 그 분리가 1,500만년 전에 발생했고, 동해 바다도 그 때 생겼다고 한다.
섬 나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는 한일(韓日) 간에 해저 터널을 뚫은 뒤 한반도를 지나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일본 북단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러시아의 사할린 섬을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가는 길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한반도를 종단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을 오가는 기차가 다니려면 한일 간에 해저 터널을 뚫어야 하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북한(北韓)을 통과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러시아 땅인 사할린을 거쳐 가는 문제는 사할린이 섬이기 때문에,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연결해야 하고 이어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유라시아 대륙] 사이를 역시 터널이나 교량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를 종단해 가는 길이 훨씬 가깝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이 유동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할린을 거쳐 가는 두 번째 방안이 현실성이 더 높고, 기술적으로도 더 쉽다고 하지만, 2,000km 가까이 돌아가는 길이 된다.
한-일 해저터널 1930년대부터 검토
첫 번째 방안인 한반도를 거쳐 가는 방안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부터 일본에서 검토된 내용이다. 소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꿈꾸던 제국주의 일본은 시모노세키(下關)나 하카타(博多), 가라쓰(唐津) 등 일본 내 한 지점과 한국의 부산(釜山)이나 거제도(巨濟島) 중 한 곳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했다.
한반도를 종단한 철도는 만주[심양]를 거쳐 베이징, 난징,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까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심양-하얼빈-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의미했다. 문제는 철도와 자동차가 다닐 한일 간의 해저(海底)터널이었다.
일본이 검토한 해저터널은 어디를 연결하는냐에 따라 노선의 길이는 210~230km 정도였고, 이 가운데 대마도(對馬島)를 거쳐가는 해저(海底) 구간은 130~145km정도였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 계획은 중단됐고, 1980년대부터 다시 두 나라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
문제는 일본을 둘러싼 지진대(地震帶)의 활동과 한반도의 분단(分斷)이 큰 장애물로 돼 있고, 한-일 어느 정부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북한한테 호구 잡히는 일이니까. 민간차원에서는 세미나도 하면서 일을 벌이고 싶어 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은 거기서 진전이 없다.
일제 시대, 관부연락선 운항
지금 한-일 간은 터널이나 교량으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16,000톤급의 대형 페리선이 부산-시모노세키 사이를 매일 운항하고 있고, 부산-오사카(大阪), 부산-후쿠오카(福岡), 부산-이즈하라, 부산-히타카츠를 오가는 여객선도 있다.
한-일 간의 해상 연결은 100년도 훨씬 넘는 과거의 일이다. 일제시대 한-일 간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연락선(連絡船)이 정기적으로 다녔다. 지금은 부관(釜關)페리 또는 관부(關釜)페리라고 하지만, 일제 때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라는 다소 로맨틱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를 묘사한 영화나 책을 보면, 경부선 열차는 부산역을 지나서 연락선이 오가는 제1부두 까지 들어갔다. 당시는 경성[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상행선(上行線)이었다. 일본이 중심이었고 도쿄역이 제국철도(帝國鐵道)의 중심이던 시절이었다.
1905년 1월 경부선(京釜線) 철도가 개통되면서 9월부터 한-일 간에 다니기 시작한 연락선은 초기에는 1,680톤급으로 승선 정원은 317명이었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잦아지자 연락선은 3,000톤급으로 커지고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한 1935년부터는 7,000톤급의 큰 선박이 투입됐다.
일본인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배표[船票]만 보여주고 탑승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 백성은 별도로 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가 있어야 했다. 걸리는 시간도 초기 11시간 반에서 7시간 반으로 단축됐다. 이 관부연락선은 1960년대 후반 작가 이병주(李炳注, 1921~1992)의 소설로도 등장했다.
동북아의 해저터널 경쟁
한-일간의 해저 터널을 알아봤지만 현재 동북아시아는 사실 터널 경쟁이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다. 우선 중국이 요동반도의 따롄(大連)항과 산동반도의 옌타이(煙台)를 잇는 123km 길이의 보하이(渤海) 해저 터널과 중국 본토와 대만을 잇는 135km 길이의 해저 터널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중이다.
본토 푸젠(福建)성과 대만의 신주(新竹)를 잇는 해저 터널은 모두 3개로 두 개는 열차 운행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전력, 통신선, 비상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 공정원(工程院)이 이미 설계를 마친 상태이다. (계속)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