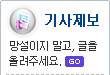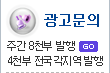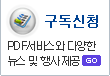|
|

|
|
뉴스로 세상읽기(5)- 중국-인도 국경분쟁의 뿌리
|
|
2020년 06월 30일(화) 16:00 [(주)문경사랑]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6월 들어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紛爭)이 자주 보도된다. 14억명 안팎의 인구를 가진 두 대국(大國)이 힘을 겨루고 있어 더욱 관심이 간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핵무기(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거의 석기시대(石器時代) 비슷하다.
지난 15일 저녁에는 돌, 못 박힌 몽둥이에다 심지어는 상대를 밀어서 계곡으로 떨어뜨려 제압하는 싸움을 한다. 급기야 중국은 각종 격투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로 구성된 부대를 이 지역으로 파견한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싸우는데도 양측에서 수십명씩 사망자[전사자]와 부상자가가 나는 것을 보면 싸움은 싸움이다.
현재 중국-인도의 국경분쟁은 3,500km에 이르는 국경선 가운데 서쪽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카슈미르(Kashmir)지역이다. 이 지역은 1947년 인도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힌두교도들은 인도(India)로,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파키스탄(Pakistan)으로 모여 각각의 독립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쟁 지역이 됐다.
영국은 560여개의 토후국(土侯國)으로 나눠져 있는 식민지 인도가 독립할 때, 각 토후국 왕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북부 ‘잠무 카슈미르 토후국’의 경우, 주민의 80% 이상이 이슬람인데도, 토후국 왕이 인도를 선택하는 바람에 ‘카슈미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오래된 카슈미르 분쟁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토후국의 주민 다수가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땅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힌두교도인 토후국 왕이 인도를 선택하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며 인도와 3차례나(1947, 1965, 1970) 전쟁을 벌이면서 까지 이 땅을 원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1962년에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을 둘러싼 영토전쟁이 발생했다. 중국은 수만 명의 병력으로 서쪽의 카슈미르 지역과 동쪽의 아루나찰프라데시 지역을 침범해 인도군 3,000여명이 전사할 정도로 일방적인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이 전쟁의 결과 22만㎢인 캬슈미르 땅 가운데 히말라야, 카라코룸, 쿤룬산맥 사이에 놓인 38,000㎢ 넓이의 악사이친(Aksai Chin) 지역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 전까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말로만 떠들었지, 사실상 버려둔 땅이었던 악사이친 지역이 중국 땅이 됐다. 파키스탄은 1963년 중국과 협정을 맺고, 악사이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인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카슈미르 분쟁은 이제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3개국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그 뒤 1996년 국경 지대 군인들의 잦은 충돌이 큰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통제선(實質統制線, Line of Actual Control)을 설정하고, 이 선을 따라 2km를 비무장지대로 정해, 양국 군인은 총기류 휴대를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중국군이 못 박힌 몽둥이 같은 비인도적인 흉기를 가지고 인도군인을 살상(殺傷)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도군은 앞으로 총기 발사로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바꿔, 더 큰 유혈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 상황은 두 나라의 서쪽 카슈미르 지역의 상황이고, 동쪽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2012년 인도 북부 시킴(Sikkim)주(州) 도클람에서 인도군 초소(벙커) 두 개가 국경 넘어 중국 땅에 설치됐다며, 중국군이 이 초소 2개를 불도저로 밀어 버려 두 나라가 대치했고, 2017년에는 중국이 도클람 지역에 군용(軍用)도로 개설에 착수하자 인도는 군대를 동원해 이를 막으면서 수천명의 양국 군인들이 두 달 이상 산중에서 대치하기도 했다.
중-인, 곳곳에서 충돌
더 동쪽으로 가면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州) 9만㎢가 있다. 중국은 인도 땅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남(南)티베트’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은 티베트(1750년부터 청 보호령)와 영국[인도]이 맺은 <심라(Simla)조약>에 근거를 두고 인도 땅이 됐는데, 중국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도는 들은 척도 않는다.
1912년 청(淸)이 멸망하고 중화민국(中華民國)이 성립되자, 티베트(Tibet)는 1913년 독립을 선언한다. 이듬 해 4월 영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인도 북부 휴양도시 심라에서 중화민국과 티베트 그리고 영국[식민지 인도] 사이의 국경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중화민국 대표는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담 도중 귀국해 버렸다. 그러나 남은 티베트와 영국[인도] 대표는 티베트의 남쪽 국경 즉 티베트와 인도 사이에 국경선을 새로 긋게 된다.
이 때 티베트 대표는 갓 독립을 선언한 티베트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영국[인도]쪽에 유리하게 획정(劃定)된 국경선에 합의했는데, 이 때 아루나찰프라데시 땅 9만㎢가 인도로 넘어간다.
이 국경선이 소위 맥마흔라인(McMahon Line)이다. 그러나 1950년 공산중국은 다시 티베트를 합병한 뒤, 심라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인도측에 아루나찰프라데시 땅 9만㎢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인도가 줄 리가 없다.
좀 복잡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인도도 중국도 내 땅은 한 평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 일본과의 사이가 다시 나빠진 요즘 대한민국의 현 민주당 정부는 이 한반도를 지킬 각오가 있는지, 좀 불안한 생각까지 든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